
대전 트램 홍보자료. 사진=대전시 제공
대전시의 트램 사업비 증액, 그 이면엔 앞선 경험 부재라는 요인이 자리잡고 있다. 해외 사례를 국내에 도입하려는 상황에서 빚어진 건설 비용 오측정이라는 것이다.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의 기준인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단가를 무리하게 낮춘 것 또한 사업비 증액을 초래한 요인으로 지적됐다.
민선 8기 대전시정 출범을 앞둔 지난 6월, 트램 건설 기본설계를 마무리한 시는 총사업비 2배 증액 사실을 알렸다. 2020년 기본계획 수립 당시 7492억 원이던 트램 사업비는 7345억 원 증액된 1조 4837억 원으로 대폭 늘었다. 사업비 증가로 기획재정부의 적정성 재검토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그러나 이는 대전만의 상황은 아니다. 부산은 오륙도 실증노선 사업비가 기존 487억 원에서 906억 원으로 증가했다. 대전과 인구 규모가 비슷한 광주의 경우 예산 2조 2114억 원의 대규모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당초 예산보다 8200억 원이 증가해 3조 1000억 원대 예산을 기재부와 협의하고 있다.
대전의 트램 사업비 증액 요인 중 건설·운영을 위한 추가 예산이 5433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여기엔 국내 사업 경험 부족과 경제성 논리에 휘말려 무리한 단가 측정 단행 등 두가지 요인에서 기인한 것으로 요약된다.
먼저 국내 사업 경험 부족으로는 대전에서 기존 예산을 추산화는 과정에서 ‘지장물 이설 비용’이 빠진 것과 연관된다.
해외에선 지장물 이설이 사업자 책임으로서 건설 비용으로 포함되지 않지만 국내에서는 행정 기관의 책임이기에 건설 비용 안에 산정됐어야 했다. 타국의 사례를 들여오는 과정에서 지장물 이설 책임을 고려하지 못했던 문제가 있었다.
또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기 위해 대전시가 비용을 무리하게 절감했다는 이유도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경제적 타당성을 살펴보게 되는데 수도권에 비해 인구가 적어 경제성이 낮을 수밖에 없는 지방은 비교적 불리할 수밖에 없다.
대전시 역시 이를 고려, 비용대비편익을 높이기 위해 비용이 적은 안을 선택했고, 실제 사업 추진 시 현실적이지 않은 예산으로 돌아오게 됐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민재홍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기획재정본부장은 “도시철도 사업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경제성 1.0을 맞추려면 유명한 서울 2호선 정도의 혼잡도를 보여야 한다”며 “지방의 사업추진 시 예산을 줄이려는 과정에서 더 낮은 단가를 나타내는 자료를 선택하고 이는 현실적이지 않은 예산으로 돌아오는 악순환을 겪게 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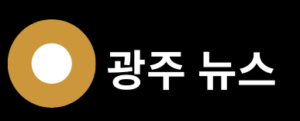

![[인터뷰] 이장우 대전시장 “국민들 ‘새정치’ 열망…충청에 전국정당 필요”](https://img.newspim.com/news/2024/12/24/2412240927473170_t1.jpg)
